필립 스탁 Philippe Starck 의 "내가 디자인을 죽였노라. I killed design." 발언을 보고 이제 미적인 면을 추구하는 디자인의 근원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 같은 사람들이 더 있다면, <Interactions>지의 이번 호(9~10월 통합본)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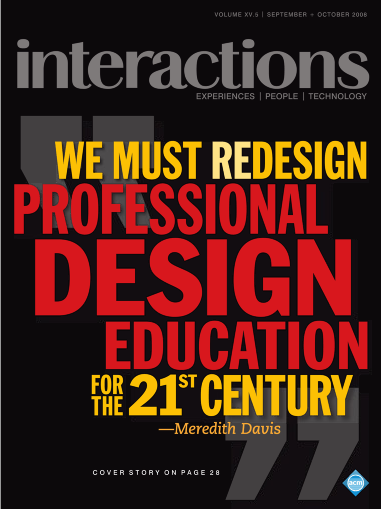
디자인 교육에 대한 내용인가 싶어서 당장 안 읽고 뒤늦게 들춰본게 아쉬울 정도로, 이번 호에 실린 대부분의 기사들은 그 행간을 꼼꼼히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다. 이번 호의 많은 기사들이 오늘날 디자인의 기본 명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 명제들은 둘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것은 "편의성/효율성 이상으로 미학적 경험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A)과 "형태 만들기 중심에서 서비스와 전략 중심의 디자인 시대가 왔다"는 주장(B)이다.
UI/HCI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술지에서 내노라 하는 필자들이 왠지 살짝 UI 적이지 않은 주장들을 한꺼번에 기고했다는 것도 참 생경하거니와, 그 주장도 어쩌면 극단적이고 어쩌면 두리뭉수리한지라 몇번이나 다시 읽어봐야 했다. 주요 글들을 내멋대로 대충 띄엄띄엄 얼렁뚱땅 설렁설렁 요약하자면 이렇다. (2주도 넘게 붙잡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이렇게 강조할 수 밖에 없는 건 원본을 읽으면 이해해 주리라 생각한다. 어찌나 행간에만 의미가 있는지 -_-;;; )
(A) by Uday Gjendar
- 미(美; beauty)를 미학적 경험으로서, ① Integrative (단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요소의 조화에 의해 기억에 남고 소구하게 되는 작용), ② Aesthetic (감각부터 지능까지 다양한 수준에서의 가치), ③ Experience (디자인의 주요 대상인 개인이 기술이나 시스템을 접하는 경험)의 세 가지로 분류
- 미(美)를 둘러싸고 있는 프레임워크의 네 가지 요소로, ① Style (How does it look & feel?), ② Performance (Does it work?), ③ Utility (Can I use it?), ④ Story (How does it all connect? What is the purpose?) 를 제시
Toto, I've Got a Feeling We're Not in Kansas Anymore...
(B) by Meredith Davis
- 디자인 실무와 교육의 갭이 점점 커지고 있음
- 디자인 개념이 "know-how"에서 "know-that"으로, 혹은 "공예로서의 디자인"에서 "학문분야로서의 디자인"으로 변화
- 최근 사례들을 통해 5가지 트렌드를 짚어볼 수 있음
① 디자인을 통해 풀어야할 문제가 점점 크고 복잡해짐
② 디자인을 사용할 사람들을 디자인 과정에 함께 참여하게 함
③ 새로 등장하는 기술들과 그 조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짐
④ 커뮤니티를 이해해야 할 중요성이 높아짐
⑤ 새로운 디자인 실무에 대한 지식 체계가 요구됨
- (솔직히 이 글은 사례 중심의 논리라서 요약할 수가 없었다 -_- )
Design in the Age of Biology: Shifting From a Mechanical-Object Ethos to an Organic-Systems Ethos
(B) by Hugh Dubberly
- 지난 30년간 전자공학의 발전과 디지털 기술은, "생산 도구로서의 컴퓨터"와 "매체로서의 컴퓨터 네트워크"에 기반한 디자인 개념의 변화를 야기
- 이러한 변화에는 ① 근본 개념 (기계공학적 관점에서 디자인을 제시하는 것에서 생태학적/유기적 관점에서 해결안 모색을 보조하는 역할로), ② 사용자에 대한 관심, ③ 서비스 디자인의 등장, ④ 기존 제품에 대한 서비스의 차별화, ⑤ 지속가능한 디자인에 주목 등이 포함
- 이러한 움직임은 60년대 포스트모더니즘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Simplicity Is Not the Answer
(A) by Donald A. Norman
- 모두가 극단적인 단순함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제품은 없음
- 많은 부가기능(feature)이 있는 제품을 사면서도 단순한 조작을 원함
- 원하는 것은 단순함이 아니라, 많은 기능으로 인한 좌절을 피하고 싶은 것
- 부가기능(feature)을 유용성(capacity)과 혼동하거나, 단순함(simplicity)을 사용편의성(ease of use)으로 혼동하고 있어 논란이 잘못 이루어지고 있음
- 좋은 디자인은 복잡함(complexity)을 올바로 다루는 디자인
- 복잡함을 다루는 방법으로는 규격화/표준화(modularization), 매핑(mapping), 개념모델(conceptual models) 등이 있다.
이 글들은 어떻게 보면 해묵은 논박("design" vs "Design")의 반복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사실 비슷한 주장을 자신의 관점에서 풀어낸, 논박이라기보다 하나의 통일된 의견으로 보이기도 한다.
특히 위 두번째 글의 제목은 이번 호 서문의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가 최근 경험하고 있는 디자인이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원래의 모습("Kansas")이 아니라는 것에 동조하는 것 같다. 말하자면 예술과 구분되는 의미에서의 디자인을 배우고 가르치던 사람들로서는 신비한 마법의 나라 "오즈 Oz"에 떨어져 버렸다는 뜻일까. 비록 글에서 담고 있는 주장(A)들은 디자인이 공업화된 제품에 "고급 취향"을 불어넣는다는 산업혁명 시대 디자이너의 주장과 전혀 다르지 않고, 주장(B)들 역시 1994년 Design Management Journal에 실렸던 <Designing Strategic Interface> 라는 논문이나 벌써 10여년전 User-Centered Design의 초창기에 수많은 논문들에서 다룬 것과 비슷하긴 하지만, 최소한 이런 글들이 한꺼번에 경쟁하듯 실리고 또 나름의 타협점을 모색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최소한 앞으로 디자인계에는 오즈에 떨어진 도로시 만큼이나 많은 모험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전통적인 UI 디자인계를 떠나 있어서 잘못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런 논란이 점점 더 심해지다가 이번에 선이 그어져 양대진영으로 나뉜 것 같은 느낌이다. 작년쯤 학계에 있는 동문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디자인의 '예술로의 회귀'라고 여겨질 정도의 방향을 잡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디자인을 순수한 '엔지니어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걸 본 적이 있다. 그때 느꼈던, 디자인이 하나의 분야로 자리잡는 게 아니라 두개의 흐름으로 분화되는 듯한 모습이 이번 호 <Interactions>지에서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 디자인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장식미술에서 디자인이 탄생한 이래에 양산기술에 맞춘 디자인에 대항한 아르누보, 다시 바우하우스와 팝아트 경향, 다시 미니멀리즘과 모던 디자인으로 이어진 갈짓자 트렌드가 우리 세대에서도 어김없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어쩌면 후세에서는 이 사건을 (사실 앞의 문장을 쓰려고 찾아본 블로그의 글에서 차용하자면) "디지털화로 저하된 경험 디자인의 질과 예술적 가치의 복원"이라고 평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디자인이 태초에 공학과 자본의 세상, 즉 대량생산을 통한 이윤을 전제로 한 "산업"에 뛰어들어 대중을 위한 "예술"의 대변자를 자처하면서, 스스로 공학과 예술의 중간자를 자청했던 것을 생각하면, 다시 그 둘의 입장으로 각각 돌아가는 이런 모습은 심지어 디자인 자체가 애당초 굳이 분화될 필요가 없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 게 사실이다. 이런 흐름이 - 만일 진짜 존재하는 거라면 - 전통적인 디자이너인 필립 스탁의 발언과 함께 정점을 찍은 "이성적인 디자인" 측면과 (약간 섣부르긴 하지만) 심리학자인 도날드 노먼 Don Norman의 <Emotional Design>을 기점으로 한켠에서 슬슬 고개를 들던 "감성적인 디자인"의 균형이라고 보는 게 맞을지, 아니면 디자인"이라는" 한때 유행한 개념이 다시 각각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계기가 될지... 그건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 아놔. 그래서 요지가 뭐냐. ㅡ_ㅡ;;; 어쨋든;;
개인적으로 좀더 관심을 끈 쪽은 주장(A) - 미학적 경험 - 쪽이다.
나름 HTI 라는 분야를 표방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서야 공학 - 특히 UI 기반기술들 - 이 원숙한 단계에 이르고 디자이너들이 마음껏 그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도 있을텐데,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기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기술들이 (순수?) 예술가들에 의해서 이제서야 깊이 이해되어 공예 수준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보다 훨씬 더 철저한 분석과 이해, 그리고 책임이 요구되는 디자인 분야와 무엇보다 이를 받아줘야 할 소비자 시장에 반영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학적 경험"에 주목하자는 위의 글들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단지 제품이나 화면 상의 형상이 아닌 다양한 '새로운' 경험을 주는 사례들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센서와 온갖 화려한 표시방법을 동원하는 UI가 등장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단지 그런 센서와 표시방법들을 "미학적 경험"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은 좀 더 HTI의 영역과 활동범위, 그리고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 이쯤해서, 누군가 "너 사실은 암 생각 없지?" 라고 해도 사실 할 말 없겠다.
예전에 한 직장동료가 만든 (물론 다양한 센서와 표시방법으로 구현된) 새로운 방식의 컨트롤러를 사용해 보면서, "이거 정말 쿨하다... 근데 왜 쿨한지 설명하기가 어렵네..."라고 하며 "이걸 어떻게 보고하지 -_-a "라고 머리를 긁적였던 적이 있다. 미디어 아트 분야가 제품의 UI를 선도할 거라면서 미디어 아트에 대한 UI 관점의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고민을 하던 동료도 있었고. 그 친구들, 이제는 슬슬 날개를 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미학적 경험이래잖냐. 화이팅. :)



